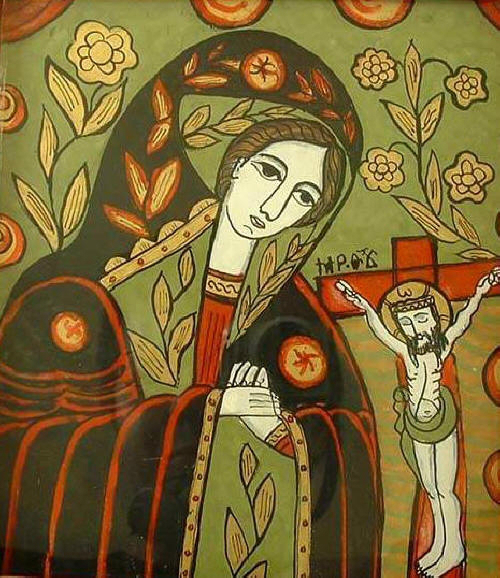|
"요즘 사람들은 여성들이 부르는 소프라노 알토 성역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16세기 이후 카운터테너는 남성가수의 본래적인 성역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헨델의 오페라 '줄리어스 시저'의 타이틀롤은 카운터테너가 맡았어요. 시저는 '남성성'(masculinity)의 대표적인 캐릭터 아닙니까 ?"
독일 비스바덴 출생으로 소년합창단으로 시작해서 17세에 만난 성악교사에게서 카운터테너로 발탁돼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성악가. 그를 만난 건 입국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없이 명랑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무척 유쾌한 친구'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이번 공연은 영화 '파리넬리'와 모 자동차 CF 배경음악이 만들어낸 '다소는 신비하고 다소는 허구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카운터테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다.
그는 카운터테너의 존재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영화 '파리넬리'에 대해선 대뜸 '영화적으로 편집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파리넬리가 실제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가 나오는 등 역사적 고증도 되지 않았다'며 날선 메스를 갖다대길 서슴지 않는다.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가톨릭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가톨릭 외에도 모든 경건함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 심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 종교음악이던 세속음악이던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된다. ※ 6척이 넘는 훤칠한 키에 '수퍼맨'의 외모를 갖추었다면 가장 남성다운 늠름한 모습일 것이다. 헨델의 ‘옴브라 마이 푸’를 부드럽고 화사한 고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여성다운 목소리일 것이다. 가장 남성적인 육체와 가장 여성적인 목소리를 한데 모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카운터테너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는 안드레아스 숄(33ㆍ독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80년대 이후 불어닥친 ‘원전 연주(바로크시대 당시의 악기와 기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함)’의 새로운 흐름을 타면서 각광받기 시작한 카운터테너는 흔히 ‘제3의 성’으로 불린다.
외모는 남성인데 목소리는 선이 고운 여성이기 때문이다.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투명한 소리를 자랑하는 카운터테너들은 원전 연주 붐과 더불어 80년대 이후 각광받고 있다. 안드레아스 숄은 카운터테너들 가운데서도 특유의 단아하고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단연 돋보이는 가수. “가슴과 머리를 함께 공명시키는 창법”과 “여성의 고음에서 남성적인 깊이를 아우른 음악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파바로티ㆍ도밍고ㆍ카레라스의 3대 테너 이후 소위 ‘빅 스리’를 이을 만한 재목이 나오지 않는 스타 기근의 성악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숄은 자작곡 ‘백합처럼 하얀(White as Lilies)’이 국내 승용차 CF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숄은 7살에 650년 넘는 전통의 소년합창단에 들어가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변성기를 맞으면서 카운터테너에 관심을 가졌다. 26살에 스승 르네 야콥스의 대타로 무대에 서면서 주목을 받은 그는 존 엘리엇 가디너, 톤 코프만 등 세계적인 원전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 입지를 굳혔다.
숄은 지금까지 독주자와 협연자로 30여종에 가까운 음반을 냈다. 숄이 프랑스의 아르모니아 문디(Harmonia Mundi)를 통해 내놓은 ‘독일 바로크 가곡집’ 등은 ‘신선한 감각’이라는 평을 얻었고, ‘17세기 영국 민요와 류트 가곡집’도 유려하고 맑은 음색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백합처럼 하얀’, ‘Maria’ 등 대중적인 레퍼토리들이 담긴 ‘Three Coutertenors’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는 아르모니아 문디에서 소속사를 데카로 옮긴 뒤 18세기 카스트라토(castratoㆍ17~18세기 이탈리아에서 변성 이전의 고음을 유지하기 위해 거세된 남성 가수) 아리아를 부른 ‘영웅들’, 그리고 비발디 앨범 등을 내놓았다. 숄은 96년에 ‘스타바트 마테르’ 등을 담은 비발디 앨범으로, 97년에는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칼다라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린 막달레나’로 권위의 그라모폰상을 거푸 거머쥐었다.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엘리자베스시대에서 모차르트 초기 오페라까지의 레퍼토리에서 빛을 발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카스트라토- 거세 통해 변성기 이전 목소리 유지
카운터테너- '팔체토' 발성법 통해 여성 음역 도전
카스트라토는 여성이 노래부를 수 없던 시대에 여성의 음역을 마음껏 넘나들면서 여자 역할을 맡았다. 카스트라토가 여성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던 이유는 ‘거세’에 있다. 변성기 이전에 거세를 시키면 후두의 발육이 멈추고 소년시절의 맑고 높은 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거세 방법엔 특수 처리된 욕조에 오래 앉아 있게 하는 방법 등이 쓰였다).
고음의 매력과 남성적인 성량, 그리고 야릇한 ‘제3의 성’이라는 매력이 대중적 호기심을 잡아당기면서 카스트라토는 바로크 오페라의 전성기를 맞아 큰 인기를 누렸다. 헨델은 46개 오페라 가운데 16 작품 이상을 카스트라토를 위해 만들었고(카스트라토는 여성이 아니라 영웅적인 남성 주역을 노래했다), 모차르트는 무반주 합창곡 ‘엑술타테 유빌라테’ 등을 카스트라토를 위해 작곡했다.
카스트라토 중 가장 널리 이름을 떨친 이는 ‘파리넬리’로 알려진 카를로 브로스키(1706~1782). 영화 ‘파리넬리’의 모델인 브로스키 때문에 오페라 작곡가 헨델은 오라토리오로 진로를 바꿔야 했을 정도라고 한다. 헨델이 채용한 카스트라토가 파리넬리에 비해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파리넬리는 삼옥타브 반을 웃도는 음역에 특유의 긴 호흡, 빼어난 외모로 스타덤에 올랐다. 18세기 이탈리아엔 카스트라토가 4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파리넬리처럼 영광을 누린 이는 극소수였다.
카스트라토는 무대에 여자가 서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금했던 반종교개혁시대와 궤를 같이 한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로마 교황청은 시스티나 성당의 성가대에 소프라노 대신 카스트라토를 앉혔다. 카스트라토에 반대했던 프랑스가 나폴레옹의 군대를 앞세워 유럽을 점령할 때까지 카스트라토는 오페라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로마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1903년에 카스트라토를 금지했다. 시스티나 대성당의 마지막 카스트라토 알레산드로 모레스키가 남긴 1904년의 녹음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카스트라토의 목소리이다.
카스트라토가 거세를 통해 변성기 이전의 목소리에 남성적 힘을 더했다면 카운터테너는 ‘팔세토(falcetto)’라는 발성법을 통해 여성 음역에 도전했다. 카운터테너(countertenor)는 테너 음역의 바로 윗 성부에 해당하는 ‘콘트라테노르(Contratenor)’를 가리킨다. 중동 지방의 코란 낭송이나 민속 음악 창법에서 기원한 팔세토는 8세기 무어인의 이베리아 반도 침략을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다. 이 창법은 16세기까지 성황을 이루다가 사라졌다. 머리에만 의존하다보니 성량이 작고 표현의 폭이 좁았기 때문이다. 카스트라토의 위세에 눌려 단종되었던 카운터테너의 맥은 1940년대에 홀연히 나타난 영국의 카운터테너 알프레드 델러에 의해 부활한다. 델러 이후 제임스 바우만과 르네 야콥을 거쳐 안드레아스 숄을 비롯, 브라이언 아사와, 데이빗 다니엘즈 등 뛰어난 카운터테너들이 나타나면서 카운터테너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숄과 어깨 겨누는 세계적 카운터테너들 눈을 감은 채 카운터테너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그들의 음악은 여느 메조 소프라노의 노래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노래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잘 들어보면 남성적이다. 남성적인 힘이 그 부드러움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숄 외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카운터테너들인 일본의 요시카즈 메라와 미국의 브라이언 아사와, 데이빗 다니엘즈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음악성이다. 다니엘즈는 카운터테너 가운데 가장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가수. 높은 음까지 단숨에 쭉뻗어 올라가는 그의 노래를 듣다보면 소름이 돋는다. 텁수룩한 수염으로 강렬한 남성적 체취를 풍기는 재킷을 본 뒤에는 자신의 눈을 아예 의심하게 된다. 영국의 ‘더타임스’가 “우연히 남자가 된 소프라노”란 찬사를 보낸 것에 절로 수긍이 간다.
아사와는 16세기 영국의 작곡가 존 다울랜드에서 20세기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아리아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수. 섬세한 고음 처리가 돋보인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에서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엔 여성적 매력이 한껏 녹아있다. 메라는 마치 미소년을 연상시키는 깨끗하고 맑은 소리로 국내에서 널리 사랑받는 가수다. 휴대전화 광고에 쓰인 헨델의 ‘옴브라마이푸’로 친숙해졌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새하얀 설원에서 울려 퍼지던 그의 노래는 눈의 차갑고 맑은 이미지와 어울려 사람들의 귀에 꽂혔다. ‘어머니의 노래’, ‘나이팅게일’ 등의 앨범으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공주’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다. |